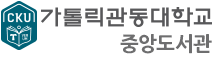상세정보

한국근대문학선
- 저자
- 이효석 저
- 출판사
- 도디드
- 출판일
- 2016-09-05
- 등록일
- 2016-10-2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30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 ─ 한 사람의 마르크시스트라고 자칭한들 그다지 실언은 아니겠지.─ 그리고 마르크시스트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으렷다.” 중얼거리며 몸을 트는 바람에 새까맣게 끄스른 낡은 등의자가 삐걱삐걱 울렸다. 난마같이 어지러운 허벅숭이 밑에서는 윤택을 잃은 두 눈이 초점 없는 흐릿한 시선을 맞은편 벽 위에 던졌다. 윤택은 없을망정 그의 두 눈이 어둠침침한 방안에서 ─ 실로 어둠침침하므로 ─ 부엉이의 눈 같은 괴상한 광채를 띠었다. ‘그러지 말라’는‘죽지 말라’의 대명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