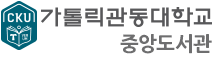용궁부연록
- 저자
- 김시습 저
- 출판사
- OLIN
- 출판일
- 2014-08-05
- 등록일
- 2016-12-21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 작품 소개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은 금오신화에 수록되어 있는 다섯 편의 단편소설 중 남염부주지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540여 년 전 우리 민족으로는 최초로 몽유록계 소설 구조를 갖추고 창작된 작품으로 조선 중기 이후 많이 창작된 몽유록계 소설의 선구가 된 작품이다.
또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나 지명, 시대적 배경 등이 모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했다는 점도 자아구현과 민족주체성 확립에 전형이 되어 온 작품이다.
이 외에도 이 소설에서는 어족(魚族)을 의인화하는 소설 작법을 도입해 게를 <곽 개사>로, 거북을 <현 선생>으로 의인화해 용왕과 더불어 살아가는 반열로 끌어올리며 그들의 움직임을 동영상을 보듯 해학적으로 묘사해 놓은 기교는 “가히 일품”이라는 문학적 평가를 수백 년 동안 받아오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 제목으로 일컬어지는 <용궁부연록(龍宮赴宴錄)>이라는 한자어 제목을 한글로 번역하면 <용궁에서 잔치에 간 기록> 또는 <용궁 잔치에 초대받다>로 풀이되는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꿈속에 용궁으로 초대되어 체험한 갖가지 기인한 이야기를 통해 세조 통치에 대한 작가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구조 유형상으로는 몽유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 작품 줄거리
이야기는 고려시대 도읍지였던 송도 천마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곳에는 표연(瓢淵)이라는 용추가 있었는데 그 용추에는 용신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예로부터 전해오고 있었다.
이곳에 젊어서부터 글을 잘 지어 문사로 평판이 자자한 한생(韓生)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한생(韓生)이 집에서 혼자 책을 읽다가 잠이 들었는데, 표연(飄然)에 살고 있는 용왕이 한생에게 사자(使者)를 보냈다. 청삼을 입고 복두를 쓴 관원이 찾아와서 “용왕이 그를 모셔오라고 했다.”면서 한생을 용궁으로 데리고 갔다.
한생이 청의동자(靑衣童子)의 안내를 받으며 함인지문(含仁之問)을 지나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조강신, 낙하신, 벽란신의 세 신왕(神王)이 먼저 초대되어 와 있었다. 용왕은 그 세 신들과 함께 한생을 반갑게 맞으면서, 한생을 초대한 이유를 밝혔다. 용왕은 무남독녀 외동딸인 공주의 화촉동방을 꾸밀 가회각(佳會閣)이라는 새 집을 짓고 상량문이 필요해 문사로 평판이 높은 한생을 용궁까지 모시게 되었다면서 자초지종을 밝혔다.
취지를 알아차린 한생이 일필휘지로 <상량문>을 지어 주자, 용왕은 잔치를 벌여 한생을 대접했다. 먼저 미녀 10여 명이 나와 벽담곡을 부르고, 그 뒤를 이어 총각 10여 명이 나와 회풍곡을 불렀다. 그러자 용왕도 옥룡적(피리)을 불며 수룡음을 읊었다. 그 뒤를 이어 곽 개사가 나와 팔풍무를 추며 노래를 불렀고, 현 선생이 나와 구공무를 추며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가 끝나자 숲 속의 도깨비와 산 속에 사는 괴물들도 나와 휘파람을 불며 함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노래가 끝나자, 먼저 초빙되어온 세 신들도 용왕에게 시를 지어 바쳤고, 그 시를 읽어 본 한생도 근체시 20운을 지어 올렸다. 용왕이 그 시를 읽어보고는 금석에 새겨 보배로 삼겠다고 만족해 했다.
잔치가 끝난 뒤, 한생은 용왕에게 용궁을 구경시켜 달라고 청했다. 용왕은 쾌히 승낙하며 시중을 드는 사자에게 명하여 한생에게 용궁 내부를 구경시켜 주었다. 한생은 여러 누각과 용궁 내의 여러 진귀한 보물들을 두루 구경하고, 용왕이 하사하는 진주 두 알과 흰 비단 두 필을 선물로 받아 용궁을 떠나온다. 사자의 등에 업혀 돌아오는 동안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그치자 눈을 또 보니 자기 집 방안이었다.
한생은 그때야 자신이 잠이 들어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나와 보니 바깥은 희뿌옇게 날이 밝아오는 오경(五更) 때였다. 그는 묘한 느낌에 자신의 품속을 더듬어 보니 꿈속에 용왕이 준 하사품이 그대로 있었다.
한생은 그 하사품을 상자 속에 넣어 간직하면서 살다가 세상의 명리가 덧없음을 느끼고 명산에 들어가 살았다. 그가 어디서 생을 마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로 소설은 끝난다.
▣ 작가 소개
미수 허목(許穆) 선생이 쓴 청사열전(淸士列傳)에 “김시습(金時習)은 본디 창해(滄海:강릉) 사람이다. 태어난 지 8개월에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5세에 <대학(大學)>ㆍ<중용(中庸)>을 환히 읽어 어른도 그를 스승으로 삼았다. 집현전(集賢殿) 학사 최치운(崔致雲)이 그를 보고 ‘뛰어난 인재이다.’ 하면서 이름을 시습(時習), 자를 열경(悅卿)이라고 지어 주었다. 세종이 이 소문을 듣고 불러 보고자 하였으나 임금의 신분상 그럴 수 없어서 승정원을 시켜 불러다 보고 그의 집에 많은 하사품을 내리면서, ‘잘 키워라. 크게 쓰일 것이다.’ 하였다. 이리하여 사방에서는 그를 ‘오세동자(五歲童子)’라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한다.
이처럼 유년시절부터 문명을 떨치며 성장한 김시습은 1435년(세종 17) 한양 성균관 북쪽, 그러니까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에서 아버지 김일성(日省)과 어머니 울진 선사장씨(仙槎張氏)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대는 신라 태종무열왕의 후손으로서 국왕으로 추대되었으나 즉위하지 못하고 명주(溟州·강릉) 군왕(郡王)으로 봉함 받았던 김주원(金周元)이었다. 할아버지 김겸간(謙侃)은 오위부장을 지낸 무반이었고, 아버지 김일성(日省)은 선대의 음서(蔭敍)로 충순위(忠順衛)를 지낸 사대부가의 후손이었으나 그가 태어날 무렵 가정환경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는 3살 때부터 외조부로부터 글자를 배우기 시작해 <정속(正俗)>, <유학자설(幼學字說)>, <소학(小學)>을 배운 후 5세 때 이미 시를 지을 줄 알아 그가 신동(神童)이라는 소문이 당시의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졌다는 내용이 어숙권(魚叔權)이 지은 <패관잡기(稗官雜記)>에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그의 생애를 알려주는 자료로는 <매월당집>에 전하는 <상류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 <윤춘년(尹春年)의 전기(傳記)>, <율곡 이이(李珥)의 전기>, <음애 이자(李耔)의 서문(序文)>, <장릉지(莊陵誌)> · <해동명신록> · <연려실기술> 등이 있는데, 그는 5세 때(1439년) 이웃집에 살고 있던 예문관 수찬(修撰) 이계전(李季甸)으로부터 <중용>과 <대학>을 배웠고, 그 후 13세 때(1447년)까지 이웃집의 성균관 대사성 김반(金泮)에게서 <맹자> · <시경> · <서경>을 배웠고, 겸사성 윤상(尹祥)에게서는 <주역>과 <예기>를 배웠으며, 그 밖의 여러 역사책과 제자백가는 스스로 읽어서 공부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작가 김시습의 생애> 편을 참조하기 바람). ●
▣ 편역자 소개
서동익(徐東翼)
소설가. 서동익은 1948년 경북 안강(安康)에서 태어나 향리에서 성장기를 보내다 1968년 해군에 지원 입대해 7년간 현역으로 복무했다. 만기 전역 후, 6·25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후 남북 관계와 북한 동포들의 삶을 연구해 오다 1997년 국가정보대학원을 수료했다.
1976년 중편소설 <갱(坑)>으로 제11회 세대신인문학상을 수상하고 등단 후 남북 분단으로 인한 <한국현대소설문학의 반쪽현상>과 <왜소성>을 발견, 이를 극복하는 장편소설을 집필하다 북한 동포들의 일상적 라이프스타일과 생활용어 속의 정치용어, 경제용어, 은어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직장을 대북전문기관인 자유의 소리방송(전문집필위원), 통일부(학술용역), 국방일보(객원논설위원), 인천남동신보(주간 겸 논설위원), 사)북방문제연구소(연구이사 겸 부소장) 등에서 근무하며 30여 년간 북한을 연구해 왔다.
주요 북한연구저서로는 <북에서 사는 모습(북한연구소, 1987)>, <인민이 사는 모습 1, 2권(자료원, 1996)>, <남북한 맞춤법 통일을 위한 사회주의헌법 문장 연구(사단법인 북방문제연구소, 2007)>, <남북한 맞춤법 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 규약 문장 연구(북방문제연구소, 2007)> 외 다수 논문이 있다.
문학창작집으로는 서동익 소설집 <갱(坑, 자료원, 1996)>, 장편소설집 <하늘 강냉이 1∼2권(자료원, 2000)>, <청해당의 아침(자료원, 2001)>, <퇴함 1∼2권(메세나, 2003)>, <장군의 여자 1∼2권(메세나, 2010)>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 <청해당의 아침>이 1960년대 한국의 문화원형과 전후세대의 삶을 밀도 있게 묘사한 작품으로 선정되어 2010년 6월 1일부터 한 달간 KBS 라디오 드라마극장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국내는 KBS AM 972khz로, 국외는 KBS 한민족방송망을 타고 중국 동북3성 ․ 러시아 연해주 ․ 사할린 ․ 일본 ․ 미국 등지로 방송된 바 있다.
고소설 편역작품집으로는 강도몽유록(OLIN, 2013), 달천몽유록, 원생몽유록, 안빙몽유록, 수성궁몽유록, 피생명몽록, 금오신화(OLIN, 2014) 등이 있다.
그동안의 창작활동으로 <제8회 인천문학상(1996)>, <남동구민상(1996)>, <인천광역시문화상(2004)>, <남동예술인상(2011)> 등을 수상했으며 <해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